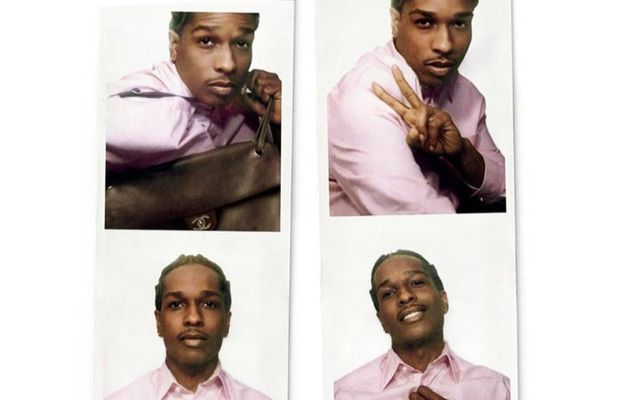사람들은 흔히 마티유 블라지를 그의 가장 최근 이력으로만 기억한다. 보테가 베네타에서 보여준 절제된 장인 정신, 소재를 다루는 정교한 감각, 일상과 환상을 공존하게 만드는 균형. 하지만 그가 샤넬에 도착하기까지는 생각보다 길고 조용한 축적의 시간이 있었다.

마티유 블라지는 2007년, 브뤼셀의 패션 스쿨 라 캉브르 졸업 컬렉션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작품을 심사하던 라프 시몬스의 눈에 띄어 곧바로 발탁됐고, 이를 계기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메종 마르지엘라, 셀린, 캘빈 클라인을 거쳐 2020년 보테가 베네타에 합류했다. 그의 커리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늘 비슷했다. 불필요한 디테일을 덜어내는 용기, 적게 말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힘. 무엇보다 브랜드의 소리를 무작정 키우기보다 알게 모르게 쌓인 잡음을 먼저 제거하는 애티튜드에 있었다.
그 모든 시간이 축적된 끝에 2026년 봄 여름 시즌, 마티유 블라지는 샤넬에서 자신의 첫 쇼를 선보였다. 뜨거운 기대와 수많은 예측 속에서 공개된 그의 첫 쇼는 커다란 우주 위에서 펼쳐졌다. 어둡고 깊은 공간, 그 안에서 부유하는 행성 구조물들, 은하수를 닮은 마블 타일이 수없이 놓인 쇼장은 샤넬이라는 거대한 우주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티유 블라지는 그 우주 한가운데에, 새하얀 도화지를 펼쳐냈다. 첫 컬렉션에서 블라지는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정리하는 데 힘썼다. 샤넬의 아이코닉한 트위드는 패브릭이라는 고정된 형태를 벗어나 어디에서든 덧입힐 수 있는 이미지가 됐다.


마티유 블라지는 실제 트위드를 사용하는 대신, 트위드 조직을 크게 확대해 촬영한 이미지를 실크 위에 프린트하거나 그 이미지와 똑같이 느슨하고 성글게 짠 니트를 사용해 새로운 트위드를 만들어내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을 꾀했다. 까멜리아도 달라졌다. 둥글고 매끈하던 꽃은 울퉁불퉁한 진주 비즈를 엮은 입체적 형태로 바뀌었다. 완벽한 모양의 장식 대신, 손의 감각이 느껴지는 변주를 택한 것이다.
샤넬 하우스의 핵심 아이템인 백에서도 같은 언어가 반복됐다. 아이코닉한 체인이 사라졌고, 퀼팅까지 덜어낸 백도 여러 번 포착됐다. 그는 샤넬을 설명하는 디테일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오랜 시간 겹겹이 쌓여 있던 헤리티지를 다시 한 번 정리했다. 파괴가 아니라 리셋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가장 조용한 룩에서 나왔다. 블랙 롱 스커트 위에 입은 화이트 셔츠 한 장. 별다른 디테일도 없이 간결하지만 눈길을 끄는 화이트 셔츠, 그 위에 필기체로 작게 수놓은 샤넬 로고를 살며시 더했다. 샤넬을 향한 마티유 블라지의 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 이 셔츠 안쪽 끝에 트위드 재킷에 사용하던 묵직한 체인을 연결한 것. 옷자락이 펄럭이지 않도록 달던 샤넬만의 기능적 디테일, 그는 그 작은 디테일을 셔츠 안으로 옮겨왔다.
마티유 블라지의 우주 속에서 샤넬의 헤리티지는 과시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조용한 구조로 존재했다. 마치 화이트 셔츠처럼 마티유 블라지는 샤넬이라는 우주에 새하얀 도화지를 펼친 것 같았다. 그것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한 공백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지울지를 충분히 파악한 선택이었다. 그는 이 첫 쇼를 두고 “완벽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가 펼쳐낸 새하얀 도화지는 결론이 아니라 가능성에 가깝다. 드디어 샤넬이, 마티유 블라지가 무엇을 그려 나갈지 궁금하게 만드는 미지의 도화지가 세상에 펼쳐진 것이다.
Copyright ⓒ 엘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