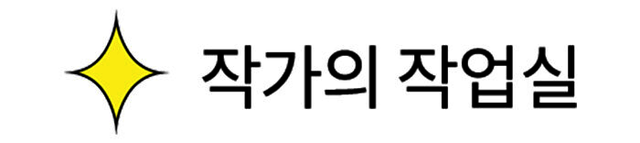일을 마치고 음식을 맛보는 시간을 기록해온 고독한 미식가, 피아노 조율사 조영권 작가가 『경양식집에서』『중국집』에 이어 이번에는 국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전국 각지의 국숫집과 32년 차 조율사의 일상이 맞물리며, 맛깔나는 음식 묘사 속에 삶의 리듬과 온기를 전하는 음식 에세이 『국수의 맛』의 작업기를 소개합니다.

『국수의 맛』 작업을 마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3년 가까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국수 자료를 정리하며 준비 기간이 길었는데, 막상 원고를 작성하면서는, 글의 완성도보다 점점 삶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게는 이번 글을 쓰는 시간이 살아가는 가치를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며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매번 작은 불안을 느끼거든요. 이번 『국수의 맛』은 전작들에 비해 개인적인 느낌이나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더 썼는데, 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평가를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어요.
경양식, 중국집에 이어 이번에는 국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가 국수가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수는 작가님의 삶에서 어떤 음식인가요?
K 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요즘이고, 다양한 식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왔지요. 하지만 우리 국수만이 주는 소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친숙하고, 비교적 저렴하고, 혼밥을 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국수의 그런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뭔가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후루룩, 만만하게 먹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피로 회복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또, 출장길에 식사를 하려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거든요. 미국의 햄버거 또는 유럽의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가 우리에게는 국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책의 원천이 된 수첩에 대해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마음으로 식당을 기록하기 시작하셨는지, 식당 선택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은 업무용 수첩에 지인들이 소개해 주는 식당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곳을 함께 메모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고, 온라인 정보라는 게 거의 없는 때여서, 사람에게 정보를 얻었어요. 그렇게 적기 시작한 게 양이 점점 늘어 별도의 수첩에 차례로 기록해 두었어요. 이제 양이 꽤 됩니다.
요즘에는 저도 SNS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데, 다른 분들의 특별해 보이는 사진을 보고 호기심이 생기면 기록합니다. 또 제 블로그에 댓글로 식당을 권유하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하나 다 살펴봐요. 그런 정보 중에 식당이나 음식을 골라서, 조율하러 갔을 때 들러 봅니다. 오래 하다 보니 제 나름 선정하는 기준이 생겼죠. 출장 전에 그 지역 식당을 몇 곳 알아두고 가면 기대감과 더불어 신나는 출장길이 됩니다. 노트에 차곡차곡 뭔가 적는다는 게 요즘 같은 디지털 세상에 시대착오라 할 수 있지만, 오랜 습관은 버리기 어렵더라고요.
흑백요리사, 두쫀쿠 등 여느 때보다 다양한 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입니다.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맛’은 무엇인가요?
자극적이지 않은 게 우리 국수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반도라는 비교적 넓지 않은 지역이지만, 전국 방방곡곡 국수의 개성이 강하기도 하고요. 독특하고 다양한 조리법이 지역마다 있어 찾아 맛보는 재미가 있어요.
짜고 매운맛보다는 수더분한 시골 국수 같은 맛을 좋아합니다. 직업상 출장이 많다 보니 밖에서 자주 사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일을 하고, 조율하러 다니며 일의 경험치가 쌓이듯이, 궁금한 음식을 많이 경험할수록 음식과 식문화에도 경험치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큰 기쁨이고요. 그래서 제게는 음식이 생계에 준하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피아노 조율 작업과 식당의 요리 장면이 교차하며 책이 전개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일상 속 ‘조용한 고수들’을 만나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일과 일상, 그리고 맛을 이야기하며 독자들과 어떤 감각이나 태도를 함께 나누고 싶으셨나요?
제가 오랫동안 궁금한 음식과 식당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좋아서’였습니다. 좋아서 하는 게 ‘취미’지요. 이렇게 별 특별할 것 없는 취미지만, 좋아서,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만의 무언가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은 여전히 별것 아니지만, 어느 순간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자신을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제게 음식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서 만나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맺는 작은 의식 같은 거예요.
식당도 마찬가지여서, 가업으로 대를 잇는 경우가 드문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또는 백여 년 된 식당들은 그들만의 비법이 있고, 오랫동안 찾아주는 손님들이 검증을 거듭하며 내공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입맛이 다른 여러 손님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식당의 노하우라 할 수 있고, 음식 맛뿐 아니라 접객 방식, 위생, 가격 등 여러 가지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니까, 성실히 차근차근, 꾸준하게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 가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취미를 즐기는 저와는 다르게, 그분들에게 그건 꽤 고된 일이어서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해온 분들을 보면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기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궁평국수 편’에서 국수를 만들다 재료가 없어 멈추는 만화 컷이 잠깐 등장합니다. 작가님만의 국수 레시피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책에 언급했던 내용대로 25년간 아내의 손맛에 길들어 있다 보니 사실 아내가 만들어 주는 국수가 가장 맛있는데, 간혹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비빔국수를 만들어 먹습니다. 냉장고에 양파와 과일을 갈아 고추장과 혼합해 비빔장을 숙성해 놓습니다. 이게 다라서 레시피랄 게 없네요.
육수를 내야 하는 물국수보다 비빔국수가 훨씬 만들기 수월해 비빔국수에 반주를 하는 때가 많은 편입니다.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결국 아내에게 순치되어 살고 있다는 이야기…
작업실을 소개해 주세요.
개인 작업실은 따로 없지만, 주로 피아노 매장에서 근무할 때 또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집 앞 카페에서 글을 쓸 때가 많습니다. 생각나는 키워드를 대충 먼저 적어 두기에 늘 필기도구와 노트를 챙기고, 카메라의 사진들을 재생해 보며 자료 정리할 때도 많아서 카메라도 챙겨 다닙니다. 그 외 특별한 루틴이나 물건은 없는 듯합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가장 의지한 반려 [ ______ ]
작업하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커피만 마십니다. 반려 커피랄까요? 국수나 중식 등 음식에는 나름 기준을 갖고 있지만, 커피에는 또 까다롭지 않아서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커피를 마십니다. 집중했을 때 누가 커피와 맹물을 바꿔둬도 모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감 후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마감 후에는 독서입니다. 특히 한동안은 손에 잡히는 대로 다독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글을 쓸 때는 제 자신과 제 경험 속에만 있기 때문에, 마감을 하고 나면 거기서 풀려나며 다른 세상을 만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가족들과 또는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피아노 업무에 집중하는 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출장을 가게 되고, 출장을 갈 때는 맛보고 싶은 음식을 자연히 떠올립니다. 결국 돌고 도는군요.
할 일이 있을 땐 그것 빼고 모두 재밌게 느껴집니다. 책을 만드는 동안 특히 재밌게 본 남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평소에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작업 중 지루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면 텔레비전을 봅니다. 특히 예능이요. 머리를 비우기 위해 보는 것이라서 프로그램 가리지 않고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비우지 않으면 채우기 어렵습니다.
풀짜장을 맛본 사람 중에는 이게 짜장면이냐며 투덜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어느 짜장면보다 맛있다. 이제는 식상한 말이 되었지만, 음식 맛은 정말 절반이 추억이다. (69쪽)
*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채널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