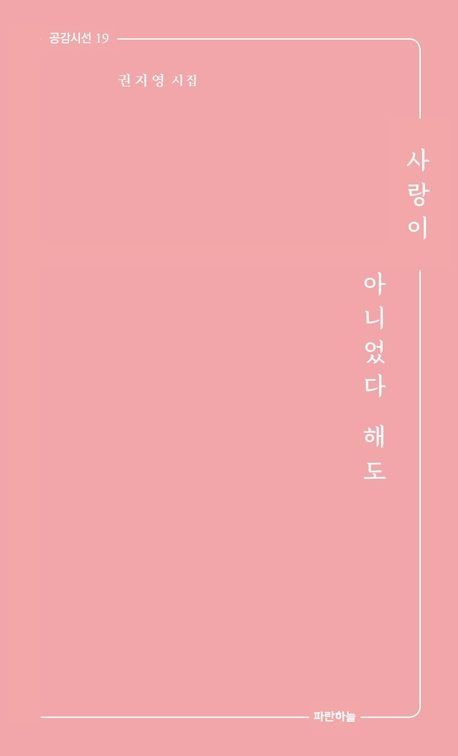
▲시집 한 줄 평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나를 보는데,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이 지나가버린다.”
▲시 한 편
<여름과 제비> - 권지영
1.
지붕 아래 제비집이 생겼다.
집 한 채에 아기 제비 네 마리 빼곡히 들어찼다.
바깥을 보며 앉은 세 마리와 거꾸로 앉아 꽁무니만 보여주는 하나.
조그만 얼굴들끼리 비좁다고 아우성치며
한시도 부리를 가만있지 않는다.
2.
어디선가 날아온 어미가 아기의 부리에 먹을 걸 전해주며 날아간다.
바람처럼 빠르게 날아와 한 입에 하나씩, 아우성치는 아가들.
여름의 무더운 하늘을 가로질러 다시 또 날아간다.
한 생을 먹이기 위해 되돌아온다.
사랑은 부지런한 어미 제비처럼
먹이는 것, 돌보는 것, 자꾸자꾸 들여다보는 것.
소용돌이치는 삶 속에서
아기 제비들의 아우성에 애벌레 하나 물려주는 것.
▲시평
시인은 “지붕 아래 제비집”을 보고 있다. 1행 “생겼다”와 2행 “빼곡히 들어찼다” 사이에는 집을 짓고 알을 낳아 품는 것과 알을 깨고 나온 새끼들의 시간이 생략되어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날의 시선과 마음도 스며있다. 둥지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다. 그곳에 알을 낳아 품고, 새끼를 키워 떠나보내는 생명의 터다. 사람의 집과 다를 것 없는 제비집 “한 채에 아기 제비 네 마리”, 그중 세 마리는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바깥을 보고 있는데, 한 마리는 안을 보고 있다. 부리 대신에 “꽁무니만 보여”주고 있다. 이미 먹이를 받아먹고 똥을 누려는 것일 수 있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소외된 혹은 초탈한 모습이다. 이 시는 크게 ‘1.’과 ‘2.’로 양분된다. ‘1.’은 먹이를 받아먹기 전의 제비집 풍경이다. 한데 이는 겉으로 드러난 풍경이고, 속을 들여다보면 시인의 유년이다. “비좁다고 아우성치”는, 즉 먼저 먹이를 달라고 다투는 와중에도 뒤에 물러나 있는 유년의 자화상이다. 길지 않은 시를 굳이 ‘1.’과 ‘2.’로 구분한 이유일 것이다. ‘2.’의 초반부는 먹이를 물고 나타난 어미와 그 먹이를 먼저 먹겠다고 “아우성치는 아가들”의 모습을, 후반부는 지극한 내리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 또한 속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되어 먹이고, 돌보고, 들여다보는 어미의 자화상이다. ‘1.’과 ‘2.’가 긴밀하게 이어져 있지만, ‘1’이 부모의 보호를 받는 시기라면 ‘2’는 부모가 되어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소용돌이치는 삶”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식을 돌보는 것이 사랑이다. 성장해도 자식은 자식이다. “한 생을 먹이기 위해” 자식 곁을 떠나지 않는다. 주위를 맴돌며 돌본다. 내리사랑은 조건이 없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준다. (김정수 시인)
▲김정수 시인은…
1990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사과의 잠』 『홀연, 선잠』 『하늘로 가는 혀』 『서랍 속의 사막』과 평론집 『연민의 시학』을 냈다. 경희문학상과 사이펀문학상을 수상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