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매거진=유정 작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드라마의 나레이션으로 알게 된 문장이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실재와 관념의 문제로 재밌어지는 담론이기도 하다. 담론까지 아니더라도 여운이 남는 나레이션이라 곱씹던 차에 구씨 작가의 개인전을 방문했다.
‘인식하지 않더라도 사물은 여기에 있다.’라는 말이 그의 첫 번째 설명이었다.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푸른빛이 켜지는 몰드, 사람이 없어도 어둠 속에서 형광빛을 내는 몰드.
“(생략) 눈앞에 놓아두고 하염없이 마주치면 이야기가 생기고 서사가 생겼다. 시간과 무관한 사물은 서사가 없었지만 시간에 속한 채로 다가가면 당연히 말이 생겨났다. 그래서 거리감이 중요했다.” - 구씨작가의 작업노트 중 일부 발췌 -

그에게 물었다.
쿵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가 답했다.
쿵 소리가 낫겠죠. 들리지 않았을 뿐.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어차피 존재하는 사물에게 사람이 어떠한 서사를 부여하지 않아도 사물은 존재한다.
네. 내가 죽더라도 내 작업물(사물)은 남아 있을 거예요, 저보다 오랫동안이요.
개인적으론 관념 이야기를 더 재밌어하는 편이지만, 나의 작업물이 나보다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마음이 기울었다. 마침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란 물음을 달고 다니기 시작한 참이다. 그런 내게 내가 없으면 작품도 없을 것이라는 것보다는 작품이 남아 나의 시선에 대한 동조를 모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치듯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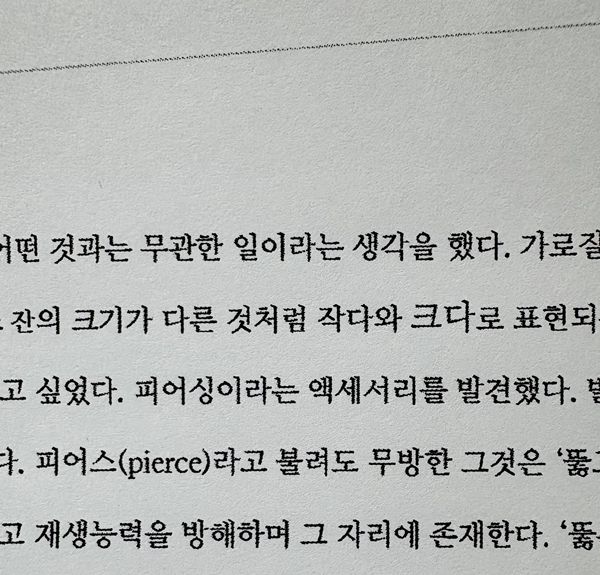
구씨는 작가노트에서 쓰이는 일부 단어도 크기를 달리 써서 프린트해 놓는 작가다. 가끔씩 그런 그를 보며 생각한다. 다른 이들이 구태여 하지 않는 행위들을 결과물로 만들어 놓는 수고로움은 그에게 수고로움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말해지는 것들 사이에서 거꾸로 흐르는 그의 발상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수고로움일 것이다- 라고.


거꾸로 생각한다는게 얼마나 단순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그의 피어싱 작업이 그렇다. 사람에게 달려 있는 피어싱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을 달고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묻는다면 그의 첫 마디를 다시 들어보자.
‘인식하지 않더라도 사물은 여기에 있다.’
‘내가 죽더라도 사물은 남아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사라지는 인간보다 오래 잔존하는) 사물이 주체가 되어 어떠한 힘을 내는 ‘능동적 사물’이라 칭해질 수 있지 않을까?
피어싱처럼 무언가를 ‘관통하고 있는’ 진행형의 사물이라면 능동성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여기까지가 그의 발상을 이해한 전부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주체가 아닌 세계를 상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만물이 점으로 찍혀 흐르고 있는 매트릭스의 화면을 보는 기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이리 말할 것이다. 가상세계는 믿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다시 다른 질문을 준비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더불어 여러분에게도 묻는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Copyright ⓒ 문화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