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최병일 칼럼니스트]
전쟁의 슬픔/바오닌 저/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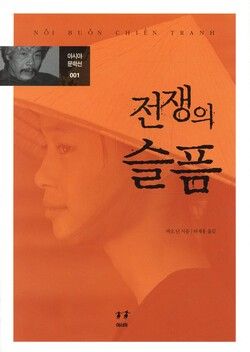
가슴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 전쟁의 슬픔을 읽은 날이 그랬다. 전쟁이 슬프기도 하고 이 안에서 이뤄지는 만남과 이별이 전쟁같은 슬픔을 안겨주기도 한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50년이 지났다. 베트남의 숲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조용하지 않았다. 총성이 멎은 자리에는 기억이 남았고, 기억은 살아남은 자를 끝까지 따라다녔다. 바오닌의 소설 '전쟁의 슬픔'은 바로 그 끝나지 않은 전쟁의 내부 풍경을 기록한 작품이다. 승리의 역사도, 패배의 기록도 아닌, 오직 살아남은 한 인간의 내면에서 반복 재생되는 전쟁이다.
전쟁 이후 첫 건기, 주인공 끼엔은 전사자 유해발군단의 일원으로 부대원들이 전멸당한 전선으로 이동 중이다. 살아남은 단 열 명의 전사 중 한 명인 끼엔은 그 지역이 익숙하다. 그 패배가 낳은 수많은 혼령과 귀신을 마주하자 끼엔의 마음속으로 바로 작년까지 이어졌던 수많은 전투와 전투에 희생된 전우들, 그리고 전쟁이 갈라놓은 첫사랑 프엉이 찾아온다.
끼엔은 열일곱 살 나이에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된다.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라면 끼엔처럼 전쟁에 나서지 않은 젊은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막 피어나기 시작한 첫사랑은 어쩌란 말인가
전쟁은 일상을 파괴하고 대지를 할퀴며 인간의 영혼을 상처를 입혔다. 끼엔에게는 그의 첫사랑 프엉만이 마음속에 유일한 실체다. 처절한 전쟁은 아군과 적군, 군인과 민간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구분 없이 너무나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끼엔의 영혼은 전쟁 속에서 메말라 간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종전.
지옥보다 끔찍한 전장을 경험한 끼엔에게 종전은 전쟁보다 실감나지 않는 현실이다. 그리고 더욱 믿기지 않는 첫사랑 프엉과의 재회!
하지만 전쟁은 프엉과의 추억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변화시키고,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방황하는 끼엔이 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쓰는 일! 끼엔은 자신이 기적처럼 살아남은 전장에서의 죽음을 쓰기 시작한다
주인공 끼엔은 전쟁이 끝난 뒤 유해 수습반으로 일한다. 죽음 이후의 죽음을 정리하는 이 아이러니한 직업은 소설의 정서를 정확히 대변한다. 그는 살아 있지만 이미 전쟁에 남겨진 사람이다. 숲속에서 발견되는 이름 없는 뼈들처럼, 그의 기억도 시간의 질서 없이 흩어져 있다. 이 소설이 연대기적 서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쟁을 겪은 사람에게 시간은 앞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의 슬픔'이 특별한 지점은 전쟁을 “참혹했다”고 말하는 데 있지 않다. 바오닌은 총알과 폭발보다, 전쟁이 인간의 감정과 사랑, 윤리를 어떻게 서서히 마모시키는지를 집요하게 바라본다. 첫사랑 프엉과의 관계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전쟁 이전의 순수는 전쟁 이후 돌아올 수 없고, 사랑은 재회가 아니라 상실의 다른 이름으로 남는다. 이 소설에서 사랑은 회복의 장치가 아니라, 상처를 더 깊이 파고드는 기억의 통로다.
문장은 차분하지만 잔혹하다. 감정은 절제돼 있지만 독자의 마음에는 오래 머문다. 이는 바오닌이 기자 출신 작가답게 감상을 과잉 설명하지 않고, 사실과 이미지의 배열만으로 감정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숲, 비, 밤, 시체, 침묵. 반복되는 이미지들은 베트남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인간의 내면 풍경처럼 읽힌다. 전쟁은 끝났지만, 자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라난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인간의 슬픔을 더 또렷하게 드러낸다.
'전쟁의 슬픔'은 흔히 반전소설로 분류되지만, 이 작품은 어떤 구호도 들지 않는다. 전쟁을 비난하지도, 영웅을 세우지도 않는다. 대신 질문을 남긴다. 전쟁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이후 없음’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베트남전이라는 특정한 역사에서 출발하지만, 읽는 이의 현재로 조용히 건너온다.
책장을 덮고 나면 묘한 정적이 남는다. 여행이 끝난 뒤 낯선 도시의 공항에 홀로 남겨진 기분과 비슷하다. '전쟁의 슬픔'은 전쟁터를 보여주기보다,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의 귀환 이후의 삶을 끝까지 따라간다. 그리고 그 여정은 말한다. 전쟁은 휴전으로 끝나지 않으며, 진짜 종전은 어쩌면 영영 오지 않는다고.
이 소설은 저자 바오닌에 자전적인 소설이기도 하다. 1952년 1월 18일 베트남 중부 응에 안 성 지엔 쩌우 현에서 출생한 바오닌의 본명은 호앙 어우 프엉. 필명은 선조들의 고향인 꾸앙 빈 성 꾸앙 닌 현 바오 닌 사에서 따왔다.
1969년 쭈 반 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일곱 살에 베트남인민군대에 자원입대했다. 3개월간 사격 등 군사훈련을 받고 인민군 이등병을 10사단에 배치 바로 B3 전선에 투입되었다. 첫 전투에서 소대원 대부분이 전사하여 5개월 만에 소대지휘관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6년 동안 최전선에서 싸웠다.
베트남전쟁의 마지막 작전이었던 사이공 진공작전에 참여한 그는 소대원들과 함께 떤 선 녓 국제공항 점령 전투에 투입되었다. 1975년 4월 30일에 남베트남 공수 부대와의 치열한 최후 교전 끝에 떤 선 녓 국제공항을 장악했을 때 살아남은 소대원은 그를 포함하여 단 두명이었다. 이 전투와 함께 길고도 길었던 베트남전쟁은 끝났고, 그는 전사자 유해발굴단에 참여하여 8개월간 베트남 산하에 버려진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한 편의 전쟁사를 공부하는 일이 아니라, 한 인간의 기억 속을 조심스럽게 걷는 일이다. 숲길을 걷듯, 발걸음을 낮추고 문장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다 읽고 나면, 우리는 안다. 이 슬픔은 베트남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있을 또 다른 전쟁의 미래형 기억이라는 것을.
뉴스컬처 최병일 newsculture@nc.press
Copyright ⓒ 뉴스컬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