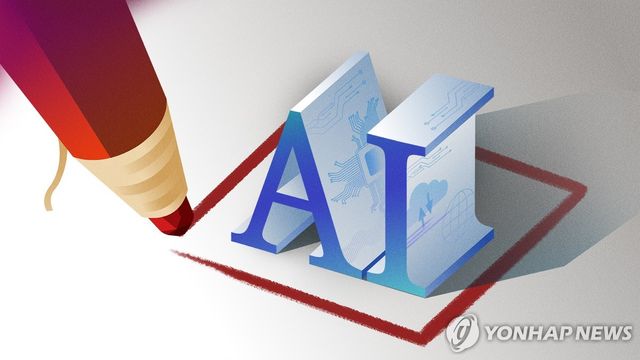공정성 훼손 논란에도 개인 일탈·교수 재량 핑계대며 후속대책 머뭇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최윤선 기자 = 'AI 커닝' 사태가 벌어진 대학들이 뚜렷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며 학생 사이에서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음에도 학교 측이 소수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교수의 재량권을 앞세우며 재발 방지 노력에 미적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최소 2명의 AI 커닝이 적발된 서울대는 '집단적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간고사는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지만, 그 이상의 후속 대책은 수립된 게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는 교수·학생을 위한 'AI 가이드라인'조차 아직 만들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 강사마다 생각이 달라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연세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강의에서 커닝 사실을 발뺌하는 학생의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유기정학은 대학 차원의 징계로, 교수가 자체 처분할 수 없다.
중간고사 재시험도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소수 윤리 의식 없는 학생들의 문제인데 (재시험으로) 다수 학생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을 정정당당하게 치른 일부 학생은 학교 측의 태도에 상대적 박탈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 처분도 없거니와, 평가의 신뢰를 회복할 제도적 개선 움직임 역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세대 재학생 A씨는 "학교도 교수도 아무런 대처 없이 평소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변하지 않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재학생 B씨도 "초동 대응을 빠르게 할 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재발 방지책은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세상이 바뀐 만큼, 시험 방법도 AI 발전에 맞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AI 커닝 등에 대한 판단과 처분을 개별 교수 재량에 맡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 재학생 조모씨는 "일부 교수는 자체적으로 AI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교수마다 달라 혼선이 많다"며 "학교 차원의 대응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suri@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