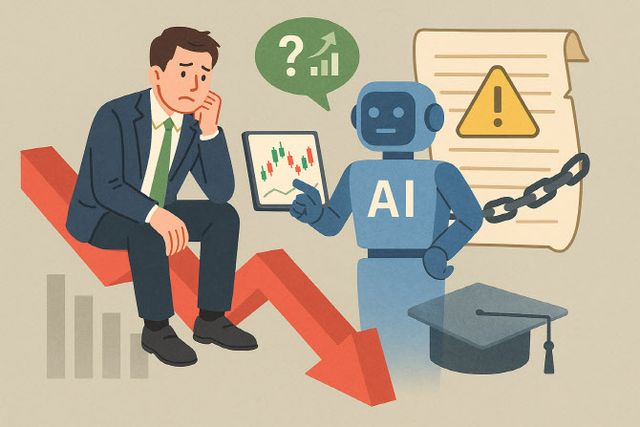한 증권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조언’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종목 전망을 묻거나 리포트를 요약해달라고 하면 몇 초 만에 답이 돌아온다.
|
문제는 기술의 속도에 비해 제도는 여전히 걸음이 느리다는 점이다. AI가 투자 판단의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제도는 아직 그에 맞는 틀을 마련하지 못했다.
AI 서비스는 투자자에게 분명히 이점이 있다.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대신 읽고 핵심만 정리해 주니 시간과 정보의 격차가 줄어든다.
그러나 지금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태가 이어지면,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증권사들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뜻 내놓기 어려워서다.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AI를 ‘조심조심’ 써야 하는 사이, 투자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단순히 법이 느리다는 게 아니다. 혁신의 속도 차이가 투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해도 위법·불법 논란을 우려해 속도를 늦춘다. 금융당국의 해석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다. 그 사이 해외 시장은 데이터 기반의 AI 분석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도구를 실전에 활용할 준비에 나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 효율성과 판단 속도 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한 발 뒤처질 위험이 커진다.
AI의 도입을 막자는 게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규제다. 명확한 책임 체계 아래에서 시장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어야 한다.
AI가 투자 판단의 일상이 된 시대, 법과 제도가 그 언어를 해석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건 결국 국내 투자자들이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누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우느냐’에 달렸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