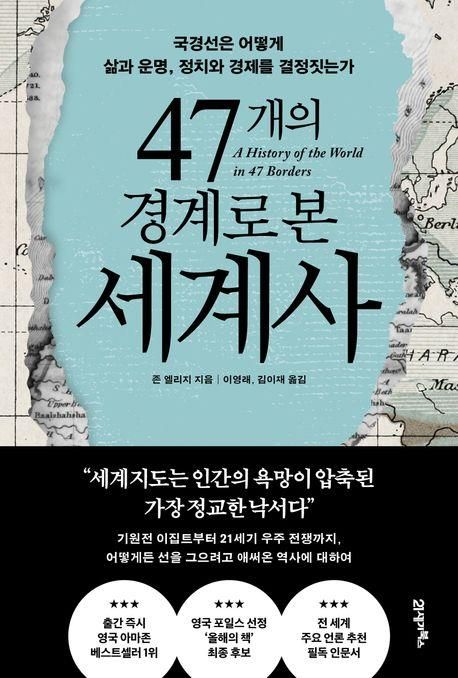국경이 만든 모순과 비극 조명한 신간 '47개의 경계로 본 세계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1884년 11월 독일 초대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 주재로 서구 14개국 대표들이 베를린에 모였다.
이듬해 2월까지 100여일에 걸쳐 열린 베를린회의(베를린서아프리카회의)라고 불리는 이 회합에서 열강은 아프리카 지도를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오직 백인들만 참석한 회의 결과 아프리카는 유럽인들이 사실상 나눠가질 수 있는 대륙이 됐다. 서구의 아프리카 식민지 분할이 본격화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직선에 가까운 국경선이 그어진 것이다.
비스마르크는 독일 식민화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에 독일 보호령을 세우도록 허가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뒤질세라 점령을 서둘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는 에리트레아와 소말릴란드를 지배했고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와 사헬 지역에 손을 뻗쳤다. 영국은 나이지리아와 동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하고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식민지에서 북쪽으로 확장했다. 강대국의 마구잡이 점령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1890년 영국 총리 솔즈베리(1830∼1903) 경의 연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지도 위에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백인도 발을 디뎌본 적 없는 곳에 말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산과 강과 호수를 나누어주었지만, 단 하나의 작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나눈 산과 강과 호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책은 이 과정에서 어떤 민족들은 역사적으로 적대적이었던 다른 민족들과 같은 나라에 묶이게 됐다며 "무책임한 국경선은 생명을 앗아간다"고 지적한다. 대륙 원주민의 자연스러운 일체감과 무관한 열강의 줄 긋기가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살육의 한 원인이 된 셈이다.
지도와 도시, 국경의 역사를 탐구해 온 영국 저널리스트 존 엘리지는 신간 '47개의 경계로 본 세계사'(21세기북스)에서 이처럼 임의적 경계에 불과한 국경선이 어떻게 분쟁의 씨앗이 되고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을 심화하는지 47가지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책은 기원전 약 4천년 전 나일강 유역에 마주하고 있던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합한 이집트 통일왕국,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의 길이만 약 2만1천㎞로 추정되는 만리장성 등 고대에 만들어진 국경부터 30년 가까이 동서를 분리하며 냉전의 상징으로 남은 베를린 장벽까지 현대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경계선들을 두루 소개한다.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경계선을 놓고 벌어진 전쟁과 대립에도 주목한다. 그중 하나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다.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연합국이 분할 통치에 나서면서 만들어진 38도선은 냉전이 격화한 가운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비무장지대(DMZ)라는 이름의 분단선으로 굳어졌다.
책은 "민간인 사망률을 비율로 계산하면,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참혹한 전쟁이었다"며 DMZ가 "남북한 사이의 완충 지대이자, 그 이름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장비로 둘러싸인 지역"이라고 규정한다.
책은 필연적이지도 영원하지도 않은 경계와 국경이 어떻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지를 조명한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독자와 함께 직시하고자 한다.
"이런 경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허영심과 어리석음을 엿볼 수 있으며, 한 시대에는 당연하고 영국적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다른 시대에는 얼마나 무작위적이고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영래·김이재 옮김. 416쪽.
sewon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