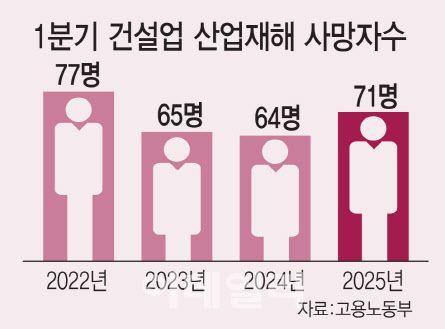3일 이데일리 취재에 응한 한 전문건설사 대표 A씨는 지난해 말 준공한 경기도 한 오피스텔 시공 현장을 이같이 떠올리며 아찔했던 사고 경험을 함께 털어놨다. 소속 근로자가 잔업을 위해 한밤중 현장에 나섰다가 결국 손바닥을 크게 베이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원청에 사전 일정 보고가 이뤄졌지만, 막판 건설현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잔업 탓에 사고 당시 안전관리 담당자조차 부재했다고 했다.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절을 기치로 안전사고 발생시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정작 건설현장 최일선 하도급 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애시당초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감축에 방점이 찍혀 공기가 빠듯하게 정해지는 현실에선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안전이 보장된 건설현장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전문건설사 임원 B씨는 “공사 빨리하라고 압박하면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괴롭히니, 결국 나중엔 현장 근로자들이 원청 직원들을 피해 몰래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마저 적잖다”며 “원청이 안전관리 원칙과 감독을 강화한다 한들 결국 현실적인 공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일선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빨리빨리’인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정부가 ‘사후적 처벌’ 강화에 앞서 공기에 쫓겨야 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악조건을 개선하는 ‘사전적 예방’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산재 처벌 강화 기조는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비를 늘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히 사고가 나면 처벌하겠다는 게 안전관리 실행 역량을 높일 수 있을진 물음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지켜 안전하게 공사를 하려면 공기가 늘어나고, 이는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현재 안전 규정들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가 요인을 일종의 사회적 비용으로 인지해 실제 공사비에 반영해주는 관례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