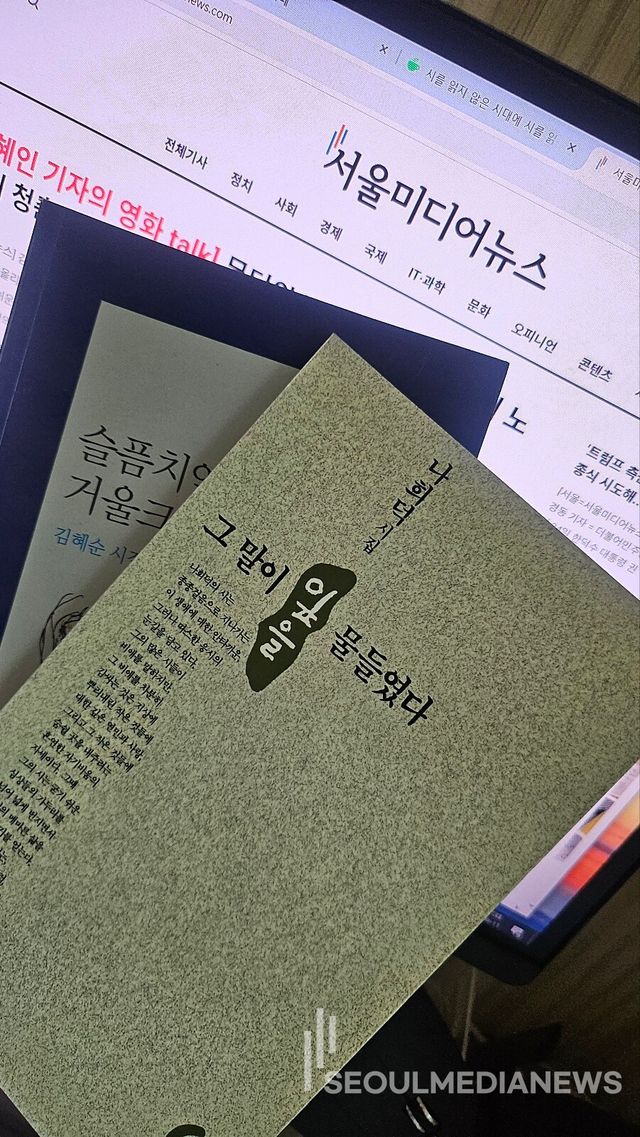
[서울미디어뉴스] 김상진 기자 = 한때 시는 누군가의 고백이었고, 시대의 숨결이었으며, 우리의 교과서에 꼭 등장하던 감정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지금, 시는 더 이상 ‘일상’이 아니다.
플랫폼 시대의 속도는 감정도 납작하게 밀어버리고, 생각도 영상보다 느린 모든 것을 구식으로 만든다. 시는 느리고 어렵고, 무엇보다도 당장 쓸모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세대의 관심에서 자연스레 멀어졌다.
그런 시대에 나는 시를 읽는다. 그리고 한 줄로 요약된 서평을 남긴다. 마치 시의 문을 닫기보다는, 작은 틈을 만들어 누군가가 다시 그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컨대 이형기의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는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마는,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읽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다. 시는 우리가 겪은 가장 조용한 순간을 가장 적은 언어로 붙잡아 두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종종,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빌려 쓴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는 말을
가장 큰 슬픔은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보내주는 용기다”*라고 변주해본다.
정현종의 '방문객'은 말한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시를 읽은 후 나는 썼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오는 순간, 삶은 시가 된다.”
시를 읽지 않는 세대에게 시를 말하려면, 설명이 아니라 감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들에게 시를 ‘배우라’ 하지 말고, 시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라고 해야 한다. 시는 누가 가르친다고 깊이 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삶의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을 누군가도 겪었구나”*라는 공감의 실금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열린다.
한 줄 서평은 시가 아니지만, 시를 데려오는 문장이다. 그것은 감상을 팔기 위한 마케팅용 문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시 한 편을 흘려보내는 창구다. 시집을 통째로 사기엔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한 줄의 문장은 스쳐 지나가며도 마음에 걸릴 수 있다.
나는 믿는다. 지금은 시를 읽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시를 ‘들려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대라고. 세상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인간의 감정은 늘 조금 느리고 오래 남는 법이다.
시를 다시 꺼내 들자. 비록 우리가 짧은 문장밖에 읽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지라도, 그 짧은 문장이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시를 읽고, 한 줄로 말을 건넨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시가 되기를 바라며.
Copyright ⓒ 서울미디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