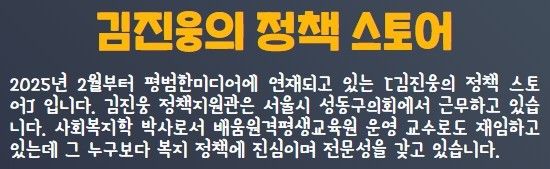※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OECD가 통계 하나를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OECD 사회 지출 업데이트 2025’를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GDP 규모로만 보면 전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15%에 불과하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이다. 한국보다 사회복지 지출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일랜드, 튀르키예 뿐이다. OECD는 사회 지출 통계(SOCX)를 2년 주기로 발표하는데 회원국들에서 운용되는 사회정책의 내용과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찾아보면 대한민국 사회지출 비중이 OECD 선진국 대비 최하위권이라는 기사들이 매번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찾아보면 대한민국 사회지출 비중이 OECD 선진국 대비 최하위권이라는 기사들이 매번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OECD의 통계는 2021년과 2022년도에 집행된 사회복지 지출 내역으로 코로나 시국 특별 기간에 지원된 △재난지원금 △코로나 검진 비용 △생활지원금 △백신 지원 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 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때를 기준으로 사회 지출 통계를 집계하다 보니 마치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펼친 것 같은데 그야말로 착시에 불과하다.
사회 지출 범주는 통상 9개 정책 영역으로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 실업, 주거, 기타(임시적 급여)로 구성된다. 9대 정책 영역 중 보건(113조원), 노령(74.6조원), 가족(34.3조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큰데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한다. 노령 분야에서 지출이 큰 이유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와 고령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보건의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 대비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OECD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변명성 보도자료를 내놨다. 여전히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변명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두 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국의 고질적인 저부담 저복지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진웅 정책지원관의 모습. <사진=본인 제공>
김진웅 정책지원관의 모습. <사진=본인 제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작은 복지국가다. 비슷한 유형으로는 튀르키예, 미국, 멕시코, 칠레 등이 있고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는 일본, 스페인, 영국 등이 있다.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있다. 우리도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 어떤 정권이 집권하든 증세 얘기를 꺼내는 것에 국민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한국은 사회보험료를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각출하여 실업, 산업재해, 출산, 노령 등의 위험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조세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는 OECD 가입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출산 지원 말고는 없다. 그나마 있는 것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실업을 당했을 때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고, 육아 휴직에 따른 급여는 본봉의 80% 수준이며,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한국은 2025년 기준 GDP 1조9000억달러(2705조원)로 OECD와 전세계 모두 10위권인데 반해 복지 지출은 OECD 기준 35위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노령, 보건, 가족, 근로 무능력, 실업 분야에서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는 최소한의 중부담 중복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보편 증세를 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평범한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이 필수적이다. 물론 늘지 않는 가처분소득, 자녀 교육비 증가, 의료 및 주거비 등에 소요되는 소득구조상 세금 인상은 그 자체로 강한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민 정책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호를 넓혀서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어떤 정책 대안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법이고 완벽한 해법은 없다. 이견과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글 수는 없다. 계속 작은 복지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큰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Copyright ⓒ 평범한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