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향의 책읽어주는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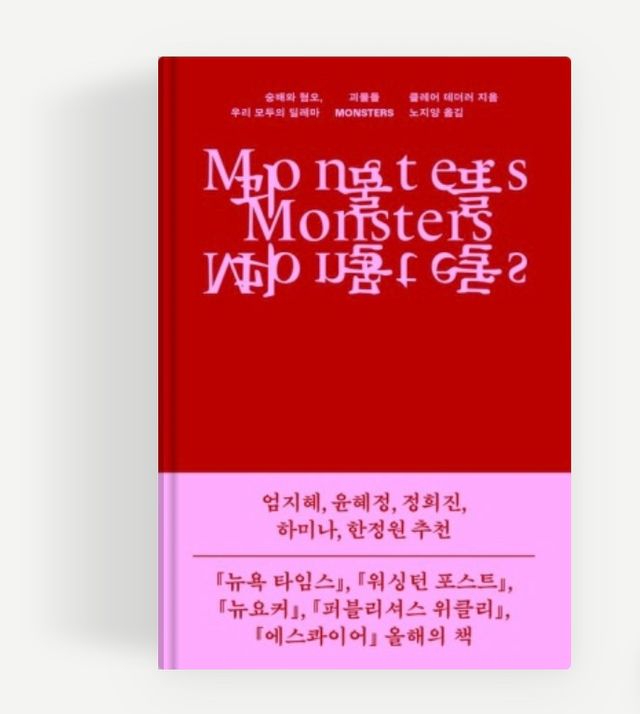
좋아하는 예술가의 사적인 비행들을 고민하는 딜레마로 시작한다. 박보나 작가는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태도가 작품이 될 때>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이 기억난다. 태도를 분명하는 일은 사실 어렵다. 저자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를 그렇게 이해한다. 인간으로서의 실수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인데, 작품에서는 너무나 풍부하고 아름답게 표현을 잘 해낸다는 것. 모순이면서도 강렬한 아름다움으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우리나라 예술가들 역시 같은 범주에 놓여있다. 저자가 언급하는 유명한 예술가들 이름이 줄을 선다. 심지어 요즘은 혐오스런 언행만으로도 그의 예술을 멀리하게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 '괴물성'에 주목하는 것이 이 책의 계획이다. 괴물 남성들의 작품을 어떻게 대할 것이가. 후반부 여성 예술가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요즘 나의 관심 키워드가 딱 맞아 떨어지는 책이 나와서 반갑다.
저자 클레어 데더러(1976~)는 영화비평가 직업에 대해서도 오래 이야기했다. 읽기와 쓰기를 연결하면서. 얼마전 <룸 넥스트 도어> 를 보고 내 생각을 블로그에 잘 썼다 생각했는데, <김혜리의 필름 클럽> 을 들으니 역시 내가 본 것 이면의 것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시각의 은유' 같은. 때로 비평을 통해 내 생각을 발견할 때의 즐거움도 좋지만, 더 많은 것을 설명할 때의 경외감에 때로 부러움이 치솟기도 한다.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나쁜 괴물들의 예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야말로 열린 결말로 끝났다. 장대한 예시들이 오갔고, 그 안에서 저자가 발굴한 나보코프나 카버가 괴물성 안으로 들어가 질타를 감수하면서 책을 써냈던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도리스 레싱이나 조니 미첼의 양육과 관련된 괴물성과 예술성도. 이전에 읽은 『나의 사랑스러운 방해자』와도 연결되었고, 얼마전 읽은 에릭 홉스봄의 『재즈』에서의 마일리 데이비스와도 연결된다.
결국 괴물인 내가 사랑하는 예술은 그 자체로 예술이라는 관점이다. 때로 그의 태도가 역겨우면 그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예술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다면 나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예술이다. 읽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술을 좋아하는지, 과연 내 삶은 괜찮은건지, 뛰쳐나가지 않고 사느라 얼마나 얘썼는지 생각도 많아졌다.
Copyright ⓒ 저스트 이코노믹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