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매거진=MIA 작가] 책 ‘그림의 시간’*은 큐레이터인 저자가 한 작품을 하루에 4시간씩, 5일에 걸쳐 바라보는 이야기다. 저자는 5주 동안 매주 한 작품씩 총 다섯 작품을 만났으며, 이 책에는 오랜 시선으로 그림을 응시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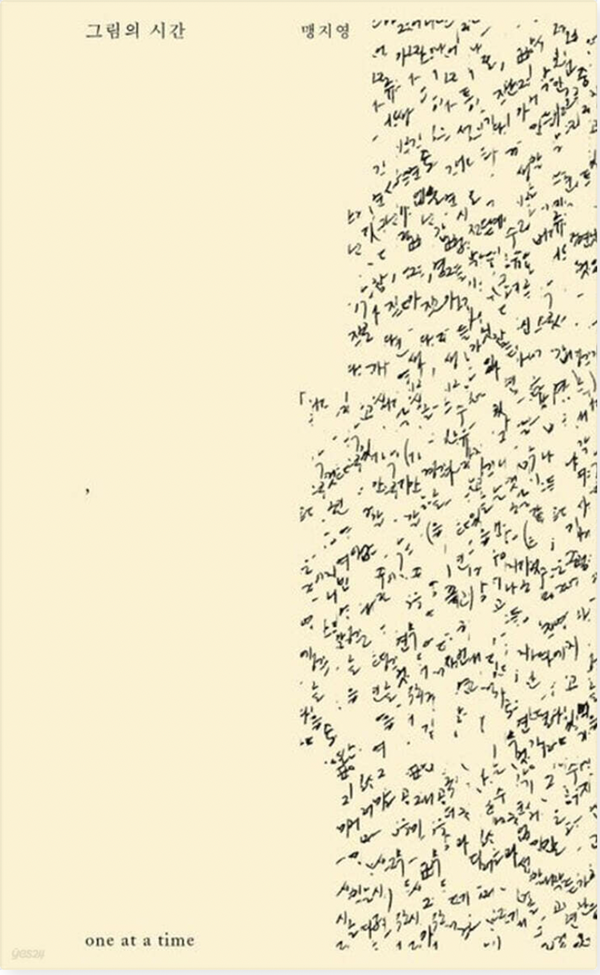
한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 내리 네 시간 동안 작품을 들여다보는 건 말 그대로 ‘정공법’(60쪽)이다. 그만큼 어딘가 기이하고 다소 기막히기도 한 이 프로젝트의 동력을, 저자는 원하는 만큼 작품을 보지 못한다는 결핍으로 설명한다.
“내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오랜 시간 앉아서 보면서 느꼈던 그 충만함, 그런 시간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관람 환경이 아쉬워지는 요즘이다. 그 덕분에 감상자이기도 하지만 기획자이기도 한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작품을 보고 있지 않음에서 오는 불만과 결핍, 그리고 안타까움이 이 기획의 동력이 되었다.” -맹지영, ‘그림의 시간’, 24쪽
나도 언젠가 느꼈던 결핍이기도 하다. 중학생이던 시절, 어느 미술관에 갔을 때였다. 나폴레옹 그림 앞에 서서 ‘이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 오래도록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 있다. 묘사된 질감과 색감이 눈 앞에서 무한하게 번져 나가는 느낌을 받은 탓이다. 아무것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는 기분이 들었고 시간을 들이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후로 그런 결핍은 빈번하고 평범한 종류가 되었고, 종종 아쉬웠지만 더 이상 의식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저 미술관의 논리에 몸을 맞춰갔을 뿐이다. 그래서도 이 프로젝트와 저자의 태도에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었지만, 궁금증이 일었다. 이렇게까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그림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의 동인은 어디에서 비롯하는 걸까?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도 사실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마음이 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타이밍이어서 너무 다행이다.” -위의 책, 228쪽
다른 질문도 피어올랐다. 스스로 이 상황에 놓이기를 자처한 저자, 그러니까 큐레이터는 과연 어떤 사람인 걸까? 단순히 작가와 작품을 돌보고** 사랑하는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기엔 이상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림에 바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앞에 썼듯 이 프로젝트가 의도한 환경을 나 또한 한때 갈망했다는 점에서 저자의 경험이 부럽기도 했지만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로 그 시간을 겪어낸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하겠다.
책을 읽으며 찾은 나름의 답은, 이러한 감상자의 태도는 그림 자체가 요청하는 욕망일 거란 사실이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 더 나은 이유를 찾지 못했다.
“화해의 장면 뒤에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어법으로 접근한다. 컷 아웃(cutout)은 줄고 주어진 장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살색과 검은색의 영역 자체에만 집중되었던 구간처럼 여기도 과거와 미래가 어지럽게 오가지 않고 현재에만 집중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도 얼핏 보이는 미래지만 그리 불안하진 않다. 새로운 형체들은 여러 흔적들을 만들며 화면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한동안 물러나 있던 검은색은 여기서는 조금 어색하게 들어오고 있다.” -위의 책, 114쪽
저자는 작가 샌정, 최상아, 이재헌, 임충섭, 정경빈의 작품을 차례로 보며 떠오르는 생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록해 나간다. 작품을 보고 느낀 감정적 단상에서부터, 그림에 관한 해석, 작가의 과거 작업 이야기, 비평, 자기 의심, 사변과 상념으로까지 제한 없이 번져간다. 글에는 저자의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간혹 다소 추상적이며 형이상학적이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너무 자의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런 건 저자도 충분히 인지하는 부분이었다.
“작가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즐거운 순간은 작업에 대한 추상적인 대화가 오갈 때다. 아마 제 3자가 듣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를 그 대화는 오로지 그림에 대한 대화인데, 작가와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오고감이기도 하다. … 그림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는 그 그림이 구상이든 추상이든 간에 추상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 바로 그 추상성 때문에 그림을 보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재밌어하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 - 위의 책 168, 169쪽
명쾌히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묘사나 말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책을 읽다가 자주 논점을 놓치거나 그걸 찾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기도 했다. 그런 독자의 읽기는 프로젝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 여겼다. 시간을 들여 작품을 들여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상을 설명하는 언어나 과정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작품 앞에 머무르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정돈되지 않은 채 흘러간다.
생각이 흘러가도록 놔두면 작품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도 있다. 혹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밀한 영역으로 이끌려가기도 하는데, 저자는 그러한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주기를 선택했다. 감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함을 발휘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책의 놀라운 지점이기도 하다. 그림을 본다는 여정에 무엇이 틀리거나 맞고, 실패할 가능성을 가늠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작가가 그림에 시간을 쏟아붓듯, 감상자도 그럴 뿐이다.
“작품의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위의 책, 93쪽
감상자의 태도는 작품에서 비롯한다. 실체 없는 진정성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림에 담긴 무엇이, 보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이끈다는 가정이 허무맹랑할까? 이 책을 통해서는 좋은 그림, 좋은 작업, 마음을 움직이는 작업의 길은 하나라고 믿어야만 할 것 같다.
* 이 책은 큐레이터 맹지영이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30일동안 다섯 작가(샌정, 이재헌, 임충섭, 정경빈, 최상아)의 작품 1점당 20시간씩(1일 4시간) 총 720시간을 관람하면서 변화하는 생각을 글로 담고, 그 관람의 시간을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송출했던 프로젝트의 기록이다. - 교보문고 책정보
** ‘큐레이터(curator)’의 어원은 라틴어 ‘cura(쿠라)’로, ‘돌보다’, ‘관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Copyright ⓒ 문화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