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향의 책읽어주는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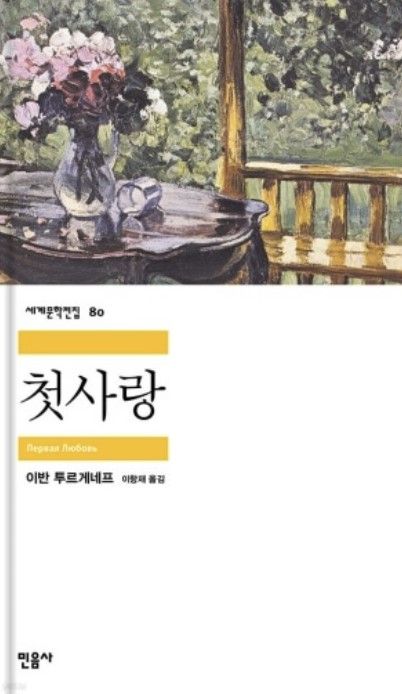
사춘기 시절에 투르게네프(1818~1883)의 『첫사랑』 을 읽었던 것 같다. 가물가물하다. 당시는 스토리 쫓아가기 바빴고, 첫사랑이라는 어휘에만 매료되었던 시절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읽는 소설은 사뭇 다른 감상이다. 어른의 세계, 사랑에 환상을 가진 청춘의 애달픔, 덧없는 인생의 상념까지로 깊게 이어진다. 사랑에 들뜬 마음만 읽었던 그때와 다르게, 현실의 인간사를 들여다 보게 되고, 그만큼 사랑의 고통에 휩쓸리며 한 시절을 통과한 인생의 깊이를 함께 겪어내는 시간이었다.
어렵지 않은 어휘와 문장들, 지극하게 표현하는 정서의 깊숙한 표현들이 아름답다. 요즘 소설과 다른 서사의 즐거움과 함께 정서에 침투하는 묘사에 반해버리는 작품이다.
그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부분이다. 불화한 부모님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 다만 일찌감치 간파하지 못했을 뿐. 아버지는 잘 생기고 신념있으며, 냉정하고 품위있는 사람이다. 어머니는 감정적이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신을 맡기지 말아야 하며 자신은 자신에게 속해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아들에게 주었다. 자신의 의지가 진짜 자유라면서. 이 부분에서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인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려서 읽을 때는 몰랐다. 아버지가 사랑에 빠진 상대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였다.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게 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을 남겼지만, 이미 그의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다. 무엇이 더 아름답고 옳은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신념은 무엇이었고, 작가는 어떤 고민과 질문을 남겨두었는가를 찾아내야 한다.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휘두르는지, 빠져 나오고나서도 얼마나 쓰린 일인지, 사랑의 열병에 빠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보여주는 전범이 아닌가. 이후로 수많은 문학과 예술에서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의 모순과 비극성을 논하는 게 아니던가. 지독하게 아픈 사랑을 탐구하는 오래된 19세기 러시아 소설이 오늘의 여기에도 의미있는 이유다. 무언가 오리지널을 읽는 기분이 좋았다.
Copyright ⓒ 저스트 이코노믹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