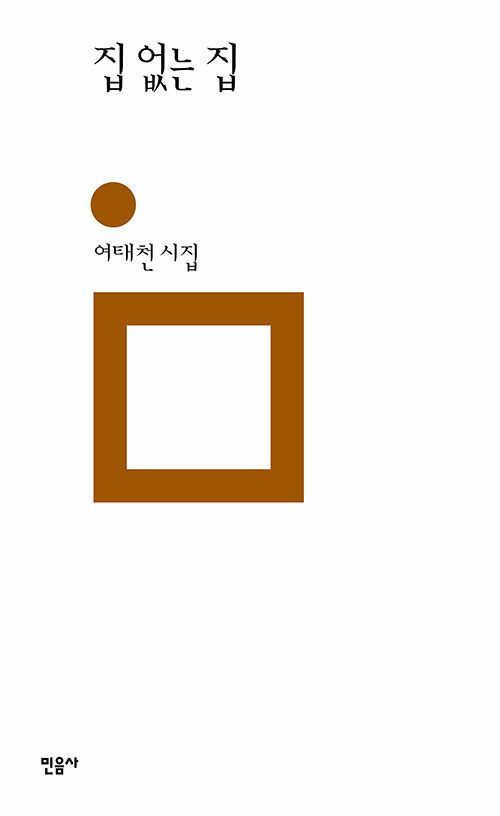
집이란 어떤 곳인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란 상투적 의미를 내포할 때도 있다. 집이라는 물성에 맞게 ‘단단한, 안정된 정착지’라는 의미일 때도 있다. 그러나 여태천 시인이 활자로 지어낸 '집 없는 집'의 문을 열면 쏟아지는 사람과 언어들이란, 하나 같이 부유하고 흔들린다. 목차만 봐도 알 수 있다. “묘비명”, “갇힌 사람”, “숨 쉬지 않는 시”, 3부는 모두 ‘포비아’ 연작으로 채워진다. 목차가 한 편의 불안하고 난해한 시처럼 읽힐 정도로. 치매가 있는 부모는 자식을 알지 못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부모를 향해 자식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진다. “누구나 일 분이면 악마가” 될 수 있고, 악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악마의 생활난). 그럼에도 시인은 라면 박스 앞에 손 모으고 있는 빈자 앞에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본다(갇힌 사람). 흔들리는 이 집들을 거닐다보면, 문득 기형도의 ‘빈집’을 마음대로 가져와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 ‘가엾은 우리들, 존재의 빈집에 갇혔네.’ ‘집’이란 곳에서 ‘편히 쉴 수 없는’ 이들에게, 흔들리면서도 정확하게 가닿을 언어들이다.
■ 집 없는 집
여태천 지음 | 민음사 펴냄 | 156쪽 | 13,000원
Copyright ⓒ 독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