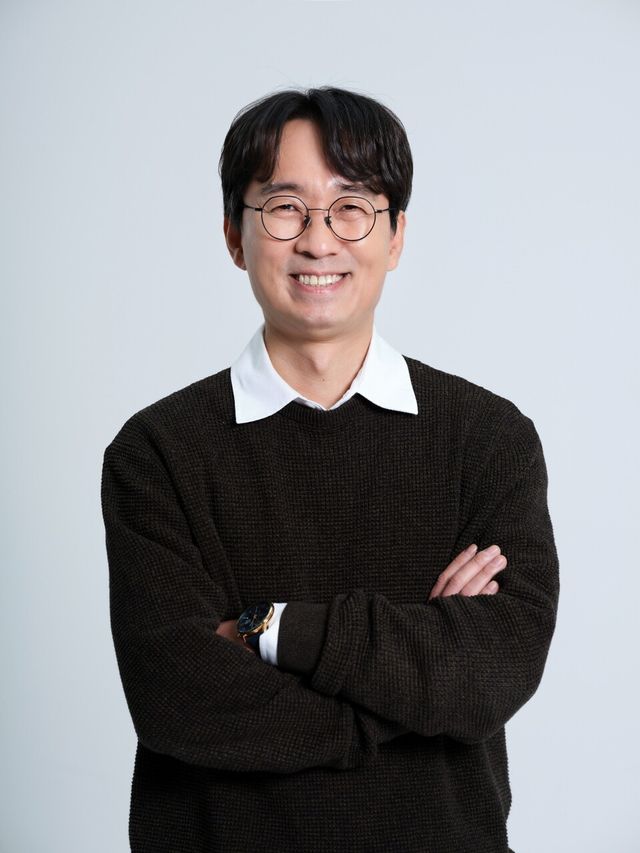
농구 소재의 이야기에 늘 전면에 나오는 것은 덩크슛이다. 상대편 링을 힘껏 내다 꽂는 쾌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가수 이승환의 노래도 ‘덩크슛’이다. 이 외에도 드리블, 스코어러, 버저비터 등 매력적인 단어가 코트 안에 있다. 장항준 감독은 그중에서 ‘리바운드’를 택했다.
루즈볼을 낚아채는 것을 말하는 리바운드는 농구 내에서 그리 화려한 장면이 아니다. 몸싸움을 통한 박스아웃으로 자리를 잡고 공을 받아내는 장면이 꼭 드라마틱하진 않다. 경기 내에 너무 많이 존재하고, 리바운드로 주어진 기회가 꼭 승리의 순간과 연결되진 않기 때문이다. 선수조차 기피하고 싶은 궂은일이다. 그럼에도 리바운드가 받쳐줘야 승리와 가까워진다. 골을 넣을 확률을 높이는 기회는 리바운드에서 시작된다.
장항준 감독이 2012년 ‘현실판 슬램덩크’라 불렸던 부산 중앙고의 전국대회 준우승 과정을 그린 영화 제목을 ‘리바운드’로 정한 건 결과가 아닌 과정을 그리려 했기 때문이다. 최약체로 꼽히다 못해 교체선수도 없었던 젊은 청춘들이 일군 성과만큼 그 과정이 더 극적이어서다.
어쩌면 장 감독에게도 ‘리바운드’를 개봉하는 시점은 리바운드의 순간일지도 모른다. ‘박봉곤 가출사건’으로 극작가로 화려하게 데뷔해 ‘라이터를 켜라’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승승장구할 것이라 기대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본업에서 활약상이 그리 뛰어나진 않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도 경험했다. 영화감독이지만, 연출보다 각본이나 각색에 더 많이 참여했다. 그해 최고 시리즈였던 SBS ‘싸인’도 연출을 하다 각본으로 넘어갔다. ‘기억의 밤’도 평단의 호평에 비해서는, 손익분기점을 가까스로 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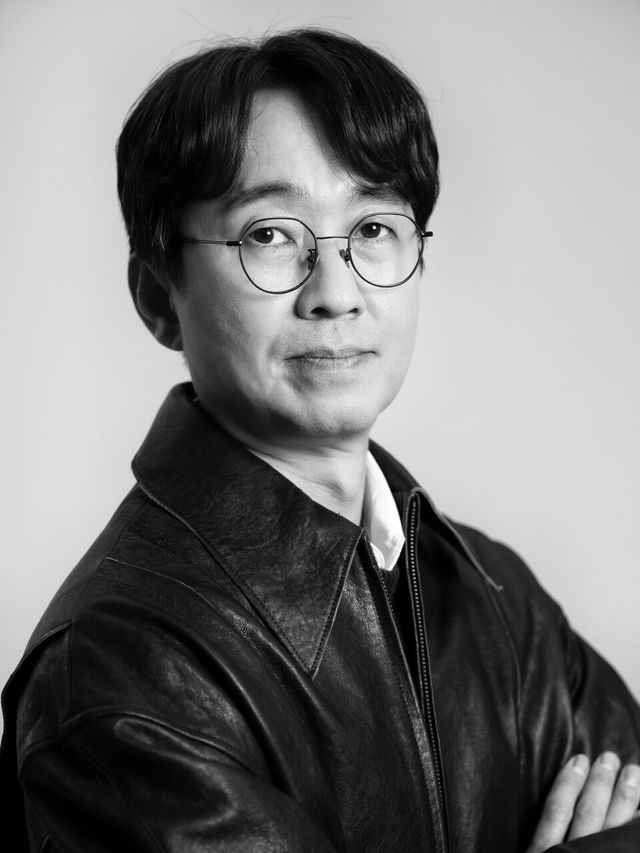
화려한 입담과 능글맞은 능청으로 예능계에서는 누구나가 사랑하는 장 감독이지만, 영화감독으로 점프하고 싶은 욕구는 상당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 못지않게, 스스로 강한 성취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 어찌 없었을까. 욕망이 이빨을 보인 것인지, 신작 ‘리바운드’는 이를 갈고 만든 듯 정교하고 훌륭하다. 전반부에 서사와 감정을 쌓고, 후반부에 통렬히 해소한다. 영화가 가진 메시지는 누구에게 위로가 된다. 오글거리거나 비장하지도 않다. 예능에서 ‘항주니’처럼 밝고 긍정적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장항준 감독이 한류타임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 감독은 극 중 부산 중앙고가 어떻게 역경을 뚫고 나가는지를 보여주려 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실패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치열하게 부딪혀서 이겨내자는 메시지다.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완성된 인격체의 스승이 와서 교화시키는 이야기에요. 실제 강양현 선수도 그런 편이었죠. 선수 생활 실패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학교에 왔을 땐 ‘나 이제 뭐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였어요. 사실 선수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모두가 ‘아직 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땀 흘리는 이야기, 강 코치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성장하죠”
‘리바운드’도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다. 부산 중앙고 스토리가 전해진 후 곧바로 BA엔터테인먼트의 정원석 대표가 취재 루트를 뚫으면서 시작했다. 권성휘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다. 무려 11년 전의 이야기다. 2018년 장항준 감독에게 시나리오가 전달됐다. 장 감독도 끓어올랐다. 김은희 작가가 시나리오를 손 봤고, 장 감독이 마무리 했다. 농구 영화라는 게 썩 인기있을 때도 아니어서 캐스팅을 하기도, 투자를 받기도 어려웠다. 중간에 엎어진 적도 있었다. 게임 회사 넥슨이 투자하면서 개봉의 빛을 보게 됐다. ‘리바운드’ 역시 여러 차례 리바운드 끝에 골밑 슛에 성공한 셈이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읽고 인터넷으로 뒤져봤죠. 불가능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투자도 만만치 않을 거고, 캐스팅도 쉽지 않겠다 싶었죠.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아내 김은희 작가가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시나리오도 바꿔주겠다고. ‘이게 웬 떡인가’ 싶었죠. 딸도 ‘아빠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내가 한다는 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실제 사건을 더 취재하고 시퀀스와 신을 재배열했다. 일부 선수들에게 서사를 부여했다. 후반부 엔딩은 마지막까지 고심하면서 고쳤다. 사실 후반 버저가 울릴 때까지 촬영이 끝났지만, 활용하지 않았다. “여자 매니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혹은 “러브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주위 의견이 있었다. 모두 무시했다.
“저는 그런 걸 딱 싫어해요. ‘슬램덩크’의 채소연이 필요하다는 말이요. 본질을 왜곡하잖아요. 세워봤자 어차피 병풍인데. 그런 인물이 실제 있지도 않았어요. 관계보다는 어떻게 역경을 이겨나가는가만 집중했어요”
영화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 전반부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캐릭터 묘사와 실패 과정을 그리고, 후반부는 어찌어찌 힘을 합친 부산 중앙고의 전국대회기다. 4강까지 파죽지세로 올라간 부산 중앙고는 당시 최강팀인 용산고와 맞붙는다. 당시 에이스로 꼽힌 허재의 둘째 아들 허훈과 상대한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전반전이 끝난 뒤 라커룸에서 강렬한 대화를 나누고 선수들이 코트로 향한다. 그러면서 감동적인 마무리 엔딩이 나온다.
“엔딩은 시나리오에 없었어요. 계속 고민하다가 중간에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았거든요. 원래는 촬영도 하지 말까 했는데, 조 감독이 준비한 건 해야된다고 해서 찍긴 찍었어요. 전 착한 사람이라 남의 말을 잘 듣거든요. 계속 생각하다가, 엔딩을 정했죠. 스태프들에게 ‘토 달지마!’라고 하면서요”

우리 곁에서 벌어진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 이야기다. 농구인들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장 감독이 꺼내든 이유는 인생도 리바운드와 같다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비록 실패한다 한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사건이 정권을 바꾼 것도 아니고,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도 아니에요. 서울시민 10명 중 한 명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해요. 우리 영화도 실패가 있었죠. 영화로 말하고 싶었던 건, 과거에 우리가 뭘 했던 간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슛 쏘는 것에 겁 내지 말자’, ‘하고 싶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얘기죠. 실패하면 다시 빨리 다른 걸 하면 되잖아요.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삽입한 대사가 ‘농구는 끝나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예요”
당시 부산 중앙고 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메시지다. 실패하더라도 노력한 것은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성공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통찰을 자연스럽고 유머스러하게 던진다. 위험할 수 있겠지만, 이 메시지를 강양현의 대사로 밝힌다.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죠.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반대로 교조적으로 들리진 않았으면 했어요. 그 지점에서 안재홍 씨와 딱 맞았죠. 너무 거룩하지 말고, 지친 선수들에게 편히 들려줄 법하게 전해달라 했어요. 강양현도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관객이 가르침을 받는 느낌을 주진 않았으면 했어요”
사진=바른손이엔티
함상범 기자 kchsb@hanryutimes.com
Copyright ⓒ 한류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