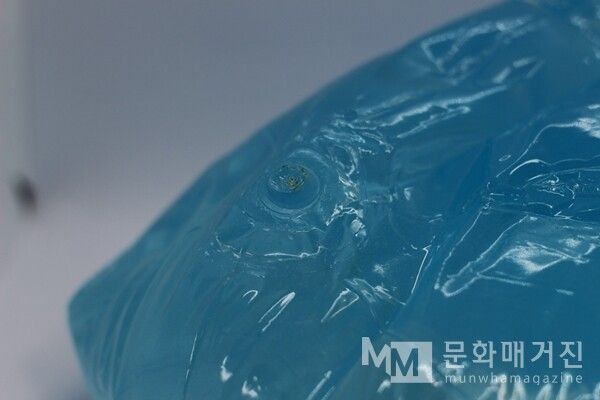
[문화매거진=구씨 작가] 시간이 지나간다. 작업실 앞 공사 중이던 건물이 베일을 벗었다. 여름 내내 작업을 하며 들었던 뚱땅거리는 소리의 뒤가 항상 궁금했는데 그 안에 붉은색의 벽돌이 재미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었을 줄이야! 놀랍다. 건물이 베일을 벗을 쯤 나도 여름옷에서 가을 겨울옷으로 옷장과 서랍을 뒤엎었고 이른 오후에 작업실 창밖으로 보이는 색이 몇 달 전보다 조금 칙칙해졌다는 생각을 했다. 작업실로 오는 길에 사람들이 자신의 살을 더 많이 가리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3호선에는 멋진 장갑 모자를 구경하는 재미가 더해졌다.
시간이 지나간 것이다.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추워지는 기온을 가장 강하게 감각하며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더 잘 느낄 수 있는지 고민해 봤다.
시간이 지나감을 가늠할 방법이 없는 게 야속하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2026년의 공모와 기획서를 위해 오랜만에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인디자인’을 열고 내 작업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을 고르며 마우스를 내려본다. 포트폴리오에 넣을 사진 4개를 위해 촬영된 사진은 40개가 훌쩍 넘었다. 핸드폰 갤러리에 내 셀카도 별로 없는데 내가 만든 것들의 사진은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게 이상하면서도 다시 한번 놀랍다.
많은 사진 속을 키보드 탭 하나로 넘나들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내 손을 지난 이것저것을 구경했다. 생각이 많지 않아서 가능했을지도 모르고 정말 궁금해서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스스로에게 느끼는 감동이 느끼해서 몸서리치다가도 지나온 시간 속의 나를 다독이는 순간도 있었다.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가듯이 내 시간도 잘 지나가고 있었다는 게 조금의 위로가 된다. 하루를 시작하며 그날을 위한 일기예보로, 변하는 온도로 감각하던 시간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었다. 걸어가는 인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옷차림을 살펴보며, 누군가의 시간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가까이에 있는 내 시간들의 이미지 파편을 마주하는 일은 분명 달랐다.
일기와 달리 이미지는 농축되어 있다. 작업노트를 쓰며 채워진 의미와 다르게 나에게 어떠한 날카로운 질감으로, 차갑던 겨울로, 철수를 하고 먹었던 순댓국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들이 좋다. 2022년, 2023년, 2024년이 흘렀고 2025년을 보냈다. 그동안 걸음수와 내가 먹은 음식들이 모두 내 근방에서 숨 쉬고 있는 것만 같다.
연말 시상식 속 연예인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수상소감을 말한다. 나에게 돌릴 영광은 없지만 따스한 시간의 온기들이 그 나누는 영광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온이 차가워지는 날에는 내가 지나온 길을 따라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이상한 김을 뿜어대는 것만 같다.
Copyright ⓒ 문화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