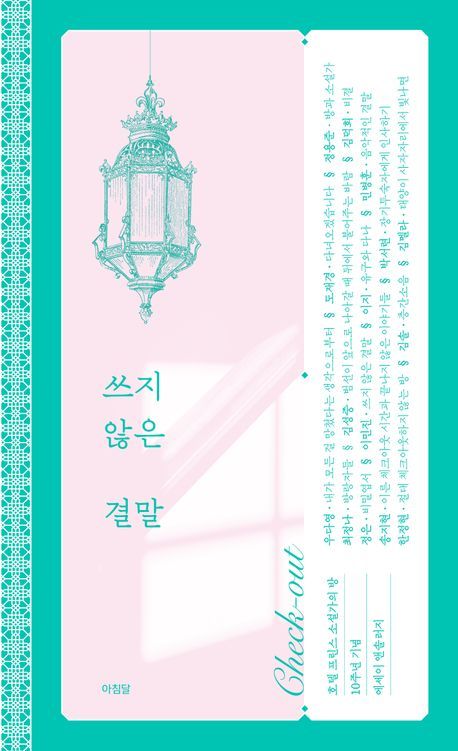
그리고 나는 그쯤에서야 내 도망이 끝났다는 것을 서서히 인지했다. 실은 내가 도망자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림으로써,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가 가진 가장 크거나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도망에서 빠져나온다. - 「내가 모든 걸 망쳤다는 생각으로부터」에서
어떠한 이야기든 결국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다. 결국 떠나보내야만 한다. 내 손을 떠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내가 어머니의 양분을 먹고 자란 독립된 개체인 것처럼 내가 쓴 이야기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 「다녀오겠습니다」에서
나는 화가 좀 나 있었는데 곧이어 슬퍼졌다. 우리 모두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았다. 모두 제 식대로 보고 판단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누군가와 나눌 수 없는 작은 고독이 밀려왔다. - 「방랑자들」에서
나에게는 토막 나지 않는 긴 시간, 일단 잠수하여 물 밖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가라앉아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 - 「범선이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에서
나는 이해받고 싶었다고 썼지만, 사실은 내 고통을 이해해서 해결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고통이라는 감정 속에 머물고 싶었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괴로움을 위로받고 싶었다. 그런데 그가 고통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소멸시키려고 하자 고통을 빼앗기는 것 같아 두려웠다. - 「비밀엽서」에서
전 가까스로 입술을 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7년간 쌓인 말들이 일시에 솟구쳐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았지만(용서와 사랑, 아마도 언니가 썼던 단어와 상동하겠죠.) 그럴 수 없었어요.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와 같은 작위적인 문장으로 아직 결말이 한참 남은 이야기를 끝내라는 강요 같아서. - 「쓰지 않은 결말」에서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머리를 흔들며 박자를 탔다. 나는 그 순간에 아직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문장들이 떠올랐다. 가령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인물의 마음과 유년 시절 마주쳤던 희미한 풍경, 잊고 지냈던 이야기의 씨앗 등이 추상적인 방식으로 조각을 맞춰갔다. - 「음악적인 결말」에서
작품에 빠져드는 순간에는 그 어떤 징조도 없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알 수 없듯이 어느 순간 와르르, 나의 온몸을 점령해 있는 것이다. 매 순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세상이 온통 그 이야기를 통해 보인다. - 「이른 체크아웃 시간과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에서
그가 꾸는 꿈에도 나는 침입할 수 있다. 나는 그의 꿈을 프로듀스한다. 설마 그런 것까지? 물론 그런 것까지. 내가 호텔일 수 있다면, 내 투숙객의 꿈을 주무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 - 「장기투숙자에게 인사하기」에서
열지 않는 문으로는 절대 너머로 넘어갈 수도 없고 당연하지만 아무 것도 볼 수도 즐길 수도 없다. 그러니까 호텔이든 소설이든 영화든 뭐든 일단 문을 열어제끼고 보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일어나야 하니까. - 「절대 체크아웃하지 않는 방」에서
그때 나는 혼자 얼마나 감격했던가. 누군가 내 글을 읽는다는 것,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나는 또 얼마나 두려웠던가. - 「태양이 사자자리에서 빛나면」에서
『쓰지 않은 결말』
우다영, 도재경, 정용준, 최정나, 김성중, 김덕희, 정은, 이민진, 이지, 민병훈, 송지현, 박서련, 한정현, 김솔, 김멜라 지음 | 아침달 펴냄 | 232쪽 | 16,000원
[정리=이자연 기자]
Copyright ⓒ 독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